-'밥 한번 먹자'는 '너와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
-오곡 중에서 가장 한맺힘이 묻어나는 보리
-한민족 생활과 문화를 담은 음식 역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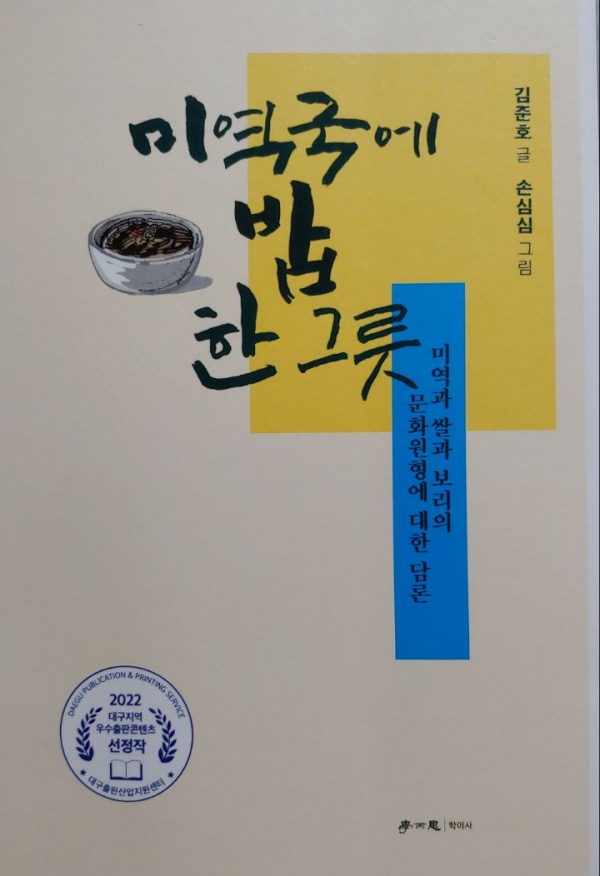
근래 읽은 책 중에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데워준 책이 있으니 '미역국에 밥 한 그릇'이다. '미역과 쌀과 보리의 문화원형에 대한 담론'이라는 부제를 단 '미역국에 밥 한 그릇'은 '학이사' 출판으로 '2022 대구지역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작'으로 뽑혔다.
저자 김준호 씨는 만능 엔터테이너(entertainer)이다. 국악인·방송인뿐만 아니라 구비문학과 민속학까지 공부한 저력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책 중간 중간에 삽입한 그림은 작가의 부인인 손심심 씨의 민속화 작품이다.
우리의 음식은 역사이고 문화이다. 음식에는 희로애락이 버무려져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쌀과 보리 한 톨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작가는 자신 삶의 경험에서 얻은 사유와 기억을 끄집어내었다. 본인의 과거를 불러와 앉히고, 공부한 풍속을 적재적소에 차려내었다. 글의 간은 짜거나 싱겁지 않고 딱 알맞다. 아니 그 이상의 맛이었다.
‘미역국에 밥 한 그릇’, 책의 제목에서 오는 느낌은 요리책이었다. 미역, 쌀, 보리는 예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 아니던가. 과거와 현대를 이어가는 푸드 에세이쯤으로 생각하고 다가갔다가 “어, 뭐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책의 내용은 미역과 쌀과 보리를 매개로 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이다. 한이 담기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 매개체 주변 이야기, 아리디 아린 역사 이야기, 우리나라를 넘어 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이야기까지 다루었다. 그야말로 광범위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자료를 모으며 집필하기까지의 시간도 만만찮았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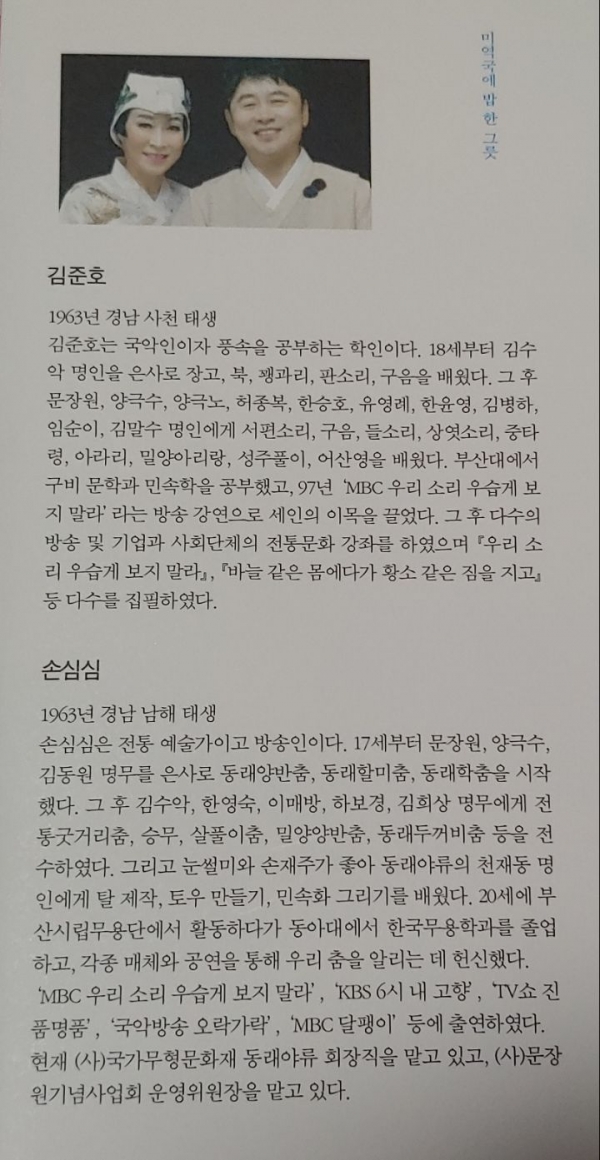
“…나는 젊은 시절부터 궁금한 것은 못 참고 꼭 해답을 찾아야 하는 편력으로 문화원형을 파헤치는 글쓰기와 그 배후에 얽힌 옛 소리를 배우며 널뛰기를 하였다. 그리고 늘 출생 음식이자 첫밥인 미역과 쌀과 보리에 대한 화두를 품고 다녔다…누구도 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쌀밥과 보리밥은 우리네 삶의 목적이고 수단이었다. 보리밥은 일상식으로 현실적인 먹거리였고, 쌀밥은 의례나 절식, 생일 등 기념할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먹거리였다…적어도 한민족에게 미역국과 쌀밥과 보리밥은 단순한 먹거리의 차원을 떠나 수천 년간 그 역사를 더해 우리네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위대하고 신앙적인 음식이었다.” -작가의 말 중 일부

‘한국인에게 미역은 단순하게 식품을 넘어, 생명을 받은 날을 상징하는 탄생 해조로 쌀밥, 김치, 된장과 함께 문화 원형질로 발전하였다. 건조한 미역은 운송의 편리함으로 두메산골 구석까지 들어갔고, 임금부터 일반 백성까지 즐기는 사시사철용 음식이었다. 한민족의 피에는 미역 국물이 흐르는 것이 틀림없다…한민족에게 미역은 해산을 주관하는 삼신할매 그 자체였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집안의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도 밥과 미역국을 소 삼신에게 올리고, 그것을 소에게도 먹였다.’

'거문도 사람들은 이 섬이 바위투성이 돌밖에 없다고 독섬이라고 불렀다…훗날 대한제국 문서에도 널리 통용하는 이 이름을 그대로 한자로 써서 석도라고 했다. 결국, 거문도 사람들이 널리 부르던 독섬이 1906년 울릉 군수 심흥택이 이를 음차하여 독도로 표기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독도가 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씻나락은 깊숙이 감추어 놓고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병든 부모님이나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그것을 하는 수 없이 꺼내 먹고 말았다. 봄에 곡식을 파종할 시기가 오자, 농부는 이웃들에게 모자라는 볍씨를 빌리러 다녔다. 사람들이 씻나락의 행방을 묻자, 배고픈 귀신이 까먹었다고 엉뚱한 핑계를 한 데서 생긴 슬픈 속담이었다…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인사로 꼭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 보다는 ’너와 친해지고 싶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었다…바보라는 말도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밥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말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부터 뫼와 산은 신성한 곳이었다. 하늘과 통하는 통로, 하늘이 뜻이 인간세계를 향해 내려오는 매개체로 여기고 산신이 머무는 곳으로 경배하였다. 여기서 ’뫼‘는 ’모시다‘는 뜻을 하나 더했다. 원래 궁중에서 왕가에 올리는 밥을 ’메‘라고 불렀다.'

‘부정한 방법으로 곡식을 바쳐 벼슬을 얻은 벼슬아치를 보리동지라 하였고, 남의 약점을 이용한 공갈법은 보리밭파수꾼, 무자비한 매질은 보리타작, 멍청하게 우두커니 앉아 자신의 의중을 밝히지 않는 사람을 보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고 했으며, 뭘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은 숙맥…여기까지도 서러운데., 보리는 성적 차별까지 받았다. 쌀과 보리는 그 모양새가 남녀의 성징과 비슷해서 과거에 쌀은 남성, 보리는 여성이라는 상징으로 통용되기도 했다…우리의 오곡 중에서 가장 서러움을 받으며 처절한 슬픔의 한맺힘이 묻어나는 곡식이 바로 보리가 아닐까 싶다…보리가 누런색으로 변하는 망종은 여름의 시작이라, 이 시기에 드는 것은 모든 것이 한맛을 더했다. 그래서 보리누름에 나는 것들은 모조리 이름에 ’보리‘를 붙였다…보리감자…보리숭어…보리멸치…보리은어…보리새우…보리굴비…이렇게 보면 보리가 맨날 오곡 중에서 가장 박대만 받던 곡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뭔가 풀어야 할 비밀이 많은 곡물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미역국에 밥 한 그릇’
-미역과 쌀과 보리의 문화원형에 대한 담론
김준호 글 손심심 그림
학이사. 1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