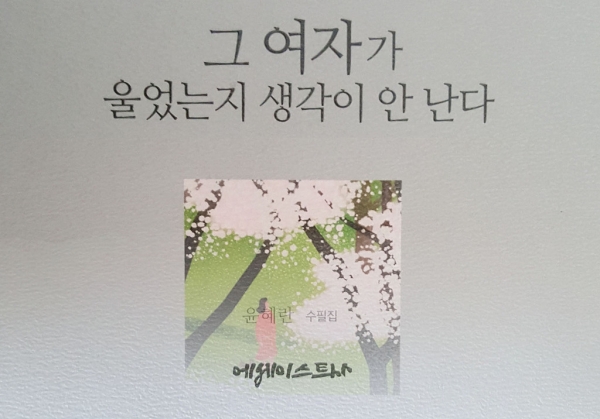
윤혜란의 ‘암병동의 사랑법’
그 여자가 울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우리는 둘 다 항암제를 맞고 종합병원의 긴 복도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어지럼증과 구토증에 눈은 쾡하고 얼굴은 하얗게 바랬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가깝게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죽는 거는 겁 안나···. 누구든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항암제는 무서워서 맞기 싫어···.”
울었던 것 같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죽는 것 겁난다. 사는 것도 겁난다. 항암제도 겁난다. 모든 게 다 겁난다.
암에 걸린 후 절망의 순간순간에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보았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살아온 것이 많았다. ‘나는 괜찮아’라며 엎어지고 넘어진 다음 자기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런 것들을 겁내야 한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훅 들어온다. 더 매슥거린다. 복도가 점점 조용해지고 우리는 나갔다.
바깥세상은 밝고 활기차며 우리와 무관하게 잘 돌아간다. 하늘은 푸르고 차들도 씽씽 잘 달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간다. 그녀와도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앞이 노랗고 다리 힘이 확 풀렸다. 길가 남의 집 담벼락에 털썩 기대어 앉았다. 눕고 싶다, 조용히 눈감고 싶다. 독약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구나. 우리 집 화장실은 푸세식이라 여름 장마철만 되면 하얀 구더기가 기어기어 올라온다. 항암제 맞은 날, 내가 화장실 두어 번 갔다 오면 구더기들은 하얗게 죽어 떠있다. 독약의 효과다. 쓰러지듯 눕는다. 편안하다, 내가 지푸라기 같다. 누군가 힐긋힐긋 쳐다본다. 부끄럽지 않다. 쳐다봐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눈가가 축축해진다. 나도 기어코 우는구나. 그랬던 것 같다.
유방은 여성의 신체 중 민감한 곳이다. 암수술 후 처음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촉진을 받기 위해선 진찰실 들어가기 전 미리 웃옷을 벗어야 했다. 벗은 옷으로 가슴을 감싸며 계면쩍게 들어서는데 의사선생님의 호통소리가 벼락 치듯 했다.
“빨리 손 치워욧!”
앞의 할머니가 굽신굽신하며 옷을 내렸다 올렸다하고 있었다. 나도 얼어붙었다. 얼른 옷을 내렸다. 눈 둘 데가 없었다.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연민으로 입이 썼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자존심과 정서는 사치다.
촉진을 마친 우리는 침대가 두 줄로 기다랗게 놓인 주사실로 갔다. 항암제를 넣은 링거를 주렁주렁 달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 그곳의 풍경은 마치 우주인의 알집 같았다. 모두 데친 배추처럼 흐늘흐늘했다. 어떤 할머니가 소리를 내질렀다.
“어 응, 부끄러운 게 당연하제. 손을 빨리 안 내린다고 소리를 질럿! 에이! 초파리 X같은 놈!!”
“우하하.”
모두가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항암제 링거가 하나도 무섭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다른 과에서 온 어린 환자들도 멋모르고 피식 웃었다. 인생만사 다 나쁜 건 아니다. 아주 가끔은 듣기 좋은 욕도 있는 법이다.
그녀와는 각별하게 병을 나누었다. 자석치료집에서, 침집에서, 개고기집에서 항암 치료중인 우린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 버텼다.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엄마였다. 병은 병이고 할 일은 할 일이었다. 나는 항암치료로 헉헉 힘들어도 딸이 대학 다니는 서울 자취집에서 밥을 해 먹이고 싶었고, 캄캄한 밤 공터로 고3 아들을 불러내어 눈물로 호소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기억조차 안 나지만, 그 순간은 모두가 절실했었다. 이웃집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된장찌개 냄새에 엄마가 생각나 계단에 앉아 눈물 흘리며 핏줄을 그리워했다. 사랑과 생의 의지를 주는 것도 가족이고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이었다.
그녀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북의 산 오름길 꼭대기에 있는 그녀의 오두막 - 황토를 발라 수리한 고가 – 에서 그녀는 푸르른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윤선생, 저 산과 들판이 전부 내 정원이야, 하,하,하, 우리 오늘을 즐깁시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리워하던 오늘이잖아.”
어느 날, 나는 침을 맞으려고 남편이 모는 차를 타고 각북 쪽으로 가고 있었다. 우뚝우뚝 솟은 산 아래 그녀의 정원인 푸른 들판을 가로지르는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던 우리 부부는 갈지자로 비틀대는 승용차를 보았다. 차는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산 쪽 수로인 오르막길을 오르는 중이었다. 이내 우리는 그녀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위험하다 싶어 그녀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차는 수로에 처박혔다. 절벽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녀의 충격은 컸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네, 남편 죽이겠어.”
그녀의 중얼거림은 낮고 조용했지만 여운이 길었다.
그녀의 병은 재발했고 그녀는 절망했다.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12시쯤이었다.
“윤선생, 나 많이 아파.”
다음날 달려간 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갔다.
그녀 말고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 중학생 아들을 두고 공장에 다니던 이혼녀는 항암비용이 없었다.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더 아팠던 그녀도 소식이 없어졌다. 췌장암 말기에 포도요법을 한다던 동서도 자식 고생시킨다며 걱정을 하다가 세상을 등졌다. 병동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던 여인도 얼마 후부터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딸, 우리의 어머니들은 풀잎 같이 연약하지만 사랑에는 강했다. 사랑 때문에 아팠고 사랑 때문에 병을 견디었고 사랑 때문에 생을 놓아 버리기도 했다. 그녀들이 놓아버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고, 놓아버릴 수 없는 것은 가족이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엄마가, 아내가, 딸이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있을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오늘을 즐기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이란 어제 가버린 사람에겐 얼마나 절실한 시간이던가.
수필집 ‘그 여자가 울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에세이스트사. 2019. 12. 1.
26〜27년 전의 일입니다. 그녀가 병원에 다녀온 날은 초죽음이 돼서 맥을 못 추었습니다. 그게 바로 항암치료였던 것이지요. 집으로 불러 밥을 차려주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지켜보는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속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이웃들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내게 애정 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함께 밥을 먹고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자주 어울렸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얼마만큼이나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역지사지하는 마음만 보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암병동의 사랑법'을 읽으며 새삼 생각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