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양은 불타는 듯 아름다웠다.
가을이 짙어지면 소평마을 주위는 온통 황금물결로 출렁거렸다. 여름 내 초록바다가 시절을 쫓아 금빛바다로 변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타고 놀던 가을바람이 들녘으로 놀러 오면 노랗게 익은 벼들은 파도타기 응원으로 반겼다. 비스듬히 서 있던 허수아비도 신이 나는지 우쭐거리고 참새들은 떼를 지어 이리저리로 날아다녔다.
황금바다에 둘러싸인 마을은 자연스레 노랗게 물들었다. 버드나무는 마을 입구에서 우물터 가는 길 따라 여러 그루 있고 우물터에서 마을 서쪽 길로 쭉 가면서 이어져 있었다. 높게 자란 버드나무의 가지에는 까치집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해마다 태풍이 몇 개나 지나가도 남아있는 것은 신기했다. 이 버드나무의 잔잔한 이파리가 노란색을 띠면 흙 담장 위에 올라 호박잎에 숨어서 뒹굴던 호박도 누런 몸통을 드러내고 탐스럽게 익은 감이 주황색으로 빛났다.
이맘때면 농부가 할일은 별로 없었다. 논에서 물을 언제 뺄 것인가 저울질하고 가을볕에 벼이삭이 잘 익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물은 너무 빨리 빼버리면 따가운 한낮 가을볕에 낟알이 충분히 영글지 못하고 너무 늦으면 논바닥이 덜 말라 벼 베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었다. 제때 벼 베기를 해야 추곡수매 시기를 맞출 수 있었다. 물을 뺄 때 미꾸라지는 물 따라 개울로 내려가고 우렁이는 논바닥 진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들은 삼베주머니를 들고 벼메뚜기를 잡으러 온 들판을 헤맸다. ‘메뚜기’라고 하면 벼메뚜기로 통했다. 때로는 송장메뚜기도 보였으나 이것은 잡지 않았다.
왼손으로 주머니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벼 잎에 붙은 메뚜기를 훌쳐서 잡았다. 그리고 주머니를 몇 번 흔들어 안에 있던 메뚜기가 도망 못 가게 한 후, 오른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 짝짓기 중에 있는 메뚜기는 몸이 무거워서 쉽게 잡혔다. 암컷 등에 수컷이 업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불랑 붙었다’라고 했다. 가끔 방아깨비도 잡았다. 방아깨비를 ‘홍굴래’ 라고 하고 방아깨비의 수컷을 ‘때때’라고 불렀다. 갑사(甲紗) 속옷에 정장을 차려 입은 우아한 귀부인 자태의 방아깨비가 왜소한 때때를 업고 있는 모습은 우스웠다. 그 외에도 메뚜기 무리에는 섬서구메뚜기, 풀무치가 있었다. 메뚜기나 방아깨비는 날이 추워지기 전에 논두렁 흙에 구멍을 뚫어 꽁무니를 밀어 넣고 알을 낳았다.
잡은 메뚜기는 쇠죽 끓일 때 삼베주머니 그대로 쇠죽 위에 얹고 삶았다. 그리고 햇볕에 바짝 말린 후, 날개와 다리를 떼어내고, 양념장에 볶아 도시락 반찬으로 했다. 많이 잡았을 때는 다듬은 후 5일장에 나가 팔기도 했다.
가을이 짙어지면서 논둑에 심어놓았던 논두렁콩도 노랗게 익고, 농로 가장자리에 수북이 자라던 잔디와 바랭이 그리고 곁의 수로에 무성하던 고마리 풀도 노랗게 변했다. 풀은 뿌리로도 번식하지만 씨앗으로도 번식한다. 바짝 마른 열매는 바람이 불거나 꼴 베는 사람에 조금만 건들려도 새까만 씨앗을 땅에 쏟았다. 콩은 스스로 껍질을 터트리고 벼도 제때 안 베어내면 낟알을 논바닥에 떨어뜨렸다.
가을은 벼나 풀이나 과일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연체동물이나 만물이 종족 보전을 위해 기꺼이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온 것도 모두 후손을 이어가려는 하늘로부터 받은 엄숙한 사명 때문일 것이다. 이 사명은 사람에게나 하찮은 미물에게나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을 터였다.
가을이면 소꼴하기가 한층 어려웠다. 줄기는 가늘어지고 잎사귀는 윤기를 잃었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보니 며칠 전에 잘려나간 낫질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시들어갔다.
해는 하루하루 짧아져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소꼴을 하러나가도 저녁 무렵이었다. 매일 베는데다 시간이 없어서 집 주위를 돌다보니 한 망태하기가 쉽지 않아, 가난한 살림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때꺼리’(끼닛거리)를 장만하여 밥을 지어야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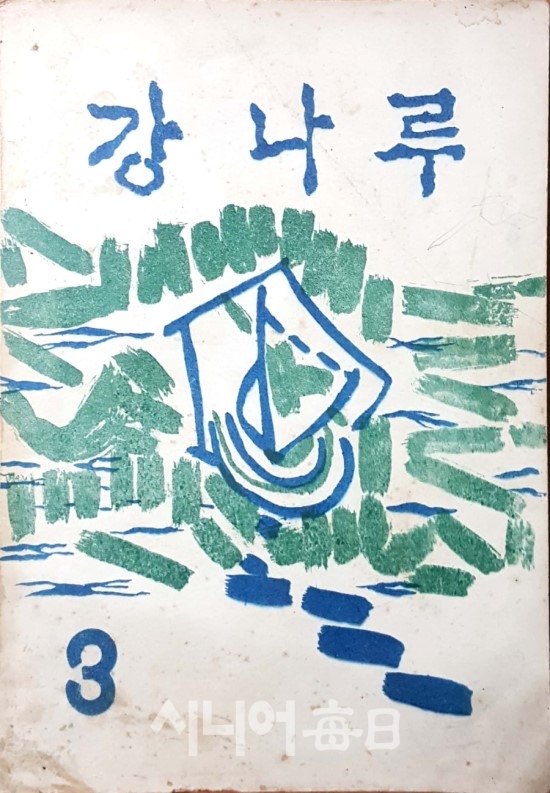
노을 비낀 언덕에 중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다. 부모는 농사일에 바쁘다보니 수업을 언제 마치든 쇠죽은 언제나 그의 차지였다. 그는 소꼴을 하다말고 오래도록 노을을 바라봤다. 태양은 멀리 ‘도덕산’ 능선에 닿을 듯 말들 머물러서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다스(Midas)의 손에 닿는 물건마다 황금으로 변하듯 노을빛이 닿은 곳곳은 황금색이었다.
그는 날마다 보는 석양이지만 어쩐지 오늘은 노을빛이 한층 찬란하다고 느꼈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에서 주인공 ‘만적’의 몸이 불에 타듯이 노을빛이 자신의 몸에 붙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청소년기의 감성이 ‘공무도하가’의 미친 사람처럼 황금들녘 위로 쏟아지는 노을의 강으로 빠져들게 했을 것이다.
그는 작문시간에 그 감흥을 되살려 ‘노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노을빛은 비스듬히 누워서 발밑까지 비추고 그는 천지간에 홀로 서서 온몸을 맡겼다. 그 글이 교지에 실렸다.
“붉게 타던 태양도 창공을 지나서/ 짙푸른 서산에 고요히 잠기려네/ 황금 빛 벌판에 황혼이 비칠 때/ 홀로 선 내 모습도 노을에 물든다.// 불그레한 하늘은 곱게 익은 사과 같이/ 아름다운 노을은 우리 아가 볼 같이/ 나도 거기 도취되어/ 빠알갛게 물든다.// 발밑까지 비춰진 노을빛을 밟으며/ 누른 빛 가을 들녘/ 논둑길을 걸을 때/ 먼 산 기슭 지평선은 땅거미가 내린다.” (‘노을’ 전문)
그가 다니고 있는 안강중학교는 안강 지역의 유일한 공립 중학교로 1949년 4월 1일에 개교했다. 학교 뒤로는 안강 평야가 펼쳐지고 있어 교가는 “안강들 넓은들 누런 벼 이삭 속에 홀연히 솟은 너 사랑의 보금자리”로 시작했다.

이 무렵 갱빈 콩밭에는 아낙네들이 콩잎을 땄다. 노랗게 익은 콩잎을 따서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은 후 무거운 돌로 눌러 놓으면 겨우내 삭았다. 삭은 콩잎을 간장에 절여 먹으면 맛있는 반찬이 됐다.


